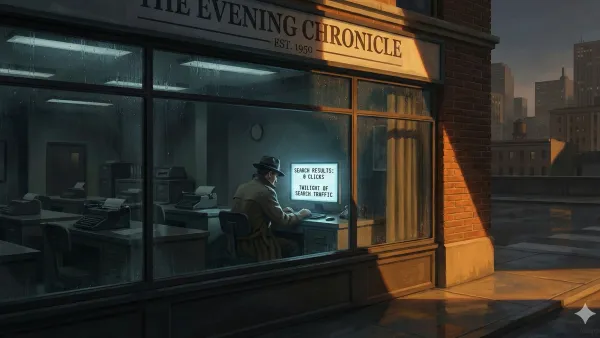전환기의 혼돈을 읽는 법: 길 찾기
일상이 지겹고 의미 없게 느껴질 때, 그것은 단순한 무기력이 아니라 새로운 전환의 신호일 수 있다. 길을 잃었다는 불안 대신 새로운 길을 찾는 과정으로 해석할 때 불확실성은 오히려 성장의 기회가 된다. 경험이라는 무거운 가구를 치워내고 ‘처음’의 에너지를 받아들이며 완성되지 않은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 그 과정이 곧 삶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는 여정이다.

요즘 따라 일이 재미없다. 별다른 이유는 없는데 - 이유가 없긴, 노화가 지속되고 있지 - 아침에 눈 뜨기가 무겁고,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간다. 분명 하는 일도 있고 해야 할 것들도 있는데, 어쩐지 활력이 없다. 가끔씩 일어나는 이벤트도 부담스럽다. 뭔가 달라져야 하는 건 아닐까.
나이를 먹을수록 이런 감정이 새삼스러운 건 아니다. 그런데 요즘은 유독 더 그렇다. 지금까지 해온 일들이 갑자기 의미 없게 느껴지고, 쌓아온 경험이 오히려 새로운 시도를 가로막는 것 같기도 하다. 지겹다. 이런 마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그냥 나이 탓으로 돌리기에는 너무 답답하고, 그렇다고 섣불리 뭔가를 바꾸기에는 위험하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이 기분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관점일까. 관점을 조금 바꾼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
길을 잃었다고? 아니면 새 길을 찾는 중?
"나는 지금 길을 잃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불안하다. 목적지도 모른 채 헤매고 있다는 기분이 든다.
철학의 이해 수업에서 자끄 데리다 얘기를 들었다. 우리가 쓰는 말이나 개념이 생각보다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다. 같은 상황도 어떤 말로 부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느껴진다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문득 생각했다.
"나는 지금 새로운 길을 찾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을 바꿔보니 같은 혼란이 탐색의 과정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하다. 그래서 요즘 내가 먹는 걸로 스트레스를 푸나 보다. 먹으면 왜 스트레스가 풀릴까. 맛있는 걸 먹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 가장 쉽게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일이니까. 대신 댓가를 치러야 한다. 몸무게라는.
몸무게도 치러야 할 한계가 있는 법이다. 그러니 이제 나는 적당히 먹고 현재의 불확실함을 "길 잃음"으로 해석하느냐, "길 찾기"로 해석하느냐의 기로에 서게 됐다. 방향감각을 잃는 것과 방향을 바꾸는 것은 초기 증상이 비슷하다. 둘 다 혼란스럽고, 둘 다 불안하다. 하지만 잃는다는 건 과거로 돌아가려 하고, 찾는다는 건 미래로 나아가려 한다. 지금 내가 느끼는 이 답답함이 퇴행의 신호인지 진보의 신호인지는, 결국 내 관점에 달려 있는 것 같다.
전문가라는 족쇄
사실 그동안 일을 잘해왔다. 그러나 어떤 핑계를 대든 지난 3~4년은 참 힘든 과정이었다. 어떻게든 이 과정을 잘 이겨냈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새로운 시도가 어려워졌다.
누구든 같은 일을 오래 하면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긴다. 전문가라고 부르기도 하고 불리기도 한다. 그런데 이 전문가라는 정체성이 양날의 검 같다. 한편으로는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가능성을 차단한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라는 고정된 자아상은 "나는 이런 사람도 될 수 있어"라는 가능성을 억압한다.
나이를 먹을수록 이 딜레마가 심해진다. 젊을 때는 시행착오를 해도 되지만, 이 나이에는 "실패할 여유"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오히려 이 나이 무렵이야말로 진짜 하고 싶은 것을 시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는 아닐까.
불안정함을 다르게 읽기
확실함은 편하다. 매일 똑같은 일을 하고, 예측 가능한 결과를 얻는다. 하지만 익숙함 속에서는 성장이 멈춘다. 새로운 자극이 없으면 뇌도 몸도 점점 굳어진다. 지금 내가 느끼는 불안정함은 어쩌면 생명체로서의 본능적 반응일지도 모르겠다.
불확실함이 주는 가능성을 다시 생각해보자.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것은 무서운 일이지만, 동시에 흥미진진한 일이기도 하다.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도 있고, 새로운 재능을 발견할 수도 있다.
나는 지금까지 콘텐트 분야에서 일을 하면서 경험이란 가장 쓸모없는, 하지만 버릴 수 없는 가구 같다는 생각을 해왔다. 치워버릴 수는 없고 자리만 차지해서 결국 공간만 차지하고 있는 그런 가구 말이다. 그런데 요즘 생각해보니 이 가구들을 치워야 새로운 걸 들일 공간이 생기는 것 같다.
처음이라는 말의 힘
"처음"이라는 말에는 특별한 에너지가 있다. 뭔가 특별한 설렘이 있는가 하면 막연한 두려움도 있다. 그래서 경험의 가구를 치워버리려면 두려움을 버려야 하고, 새로운 에너지를 받을 준비를 해야 한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완성되지 않는다. 그러나 완성되지 않은 채로 정체하는 건 가능하다. 정체를 피하려면 공간을 만들어야 하고 변화를 받아들여야 한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가 아니라 "나는 이런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해야 하는 거 같다.
아주 나쁘게 생각하면 지금은 바닥을 계속 내려가는 중이거나 어느 정도 정체된 상태겠지. 그러나 고민을 시작한다는 건 전환할 가능성도 있다는 신호 아닐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게 관대해지는 것이다. 전환기에서 정체하지 않고 새로운 것을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에너지를 발산하는 일이다.
지금 이 순간, 나는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찾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